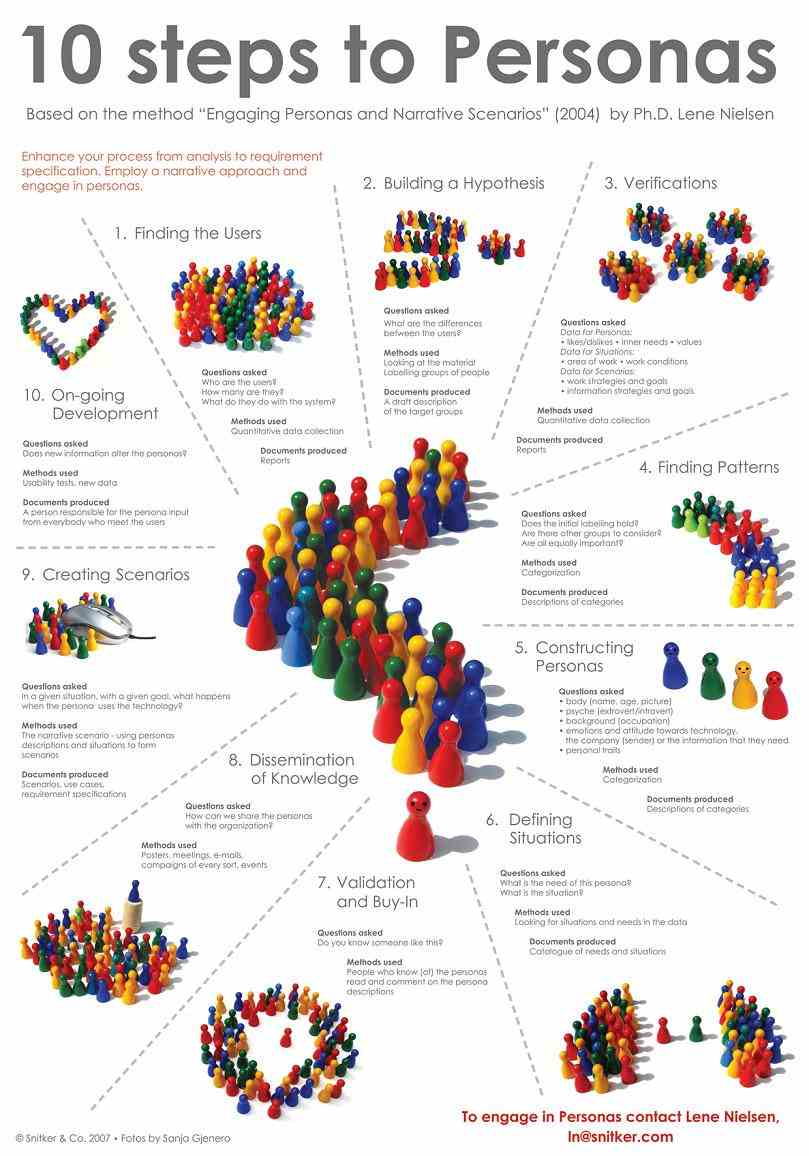"Bad money drives out good." - Thomas Gresham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유명한 말이다. 16세기 영국의 Gresham이 당시 영국왕인 엘리자베스1세에게 보낸 편지에 적은 구절이다. (참고 URL :
Gresham's law from wikipedia) 금, 은이나 구리와 같은 소재의 실질가치가 서로 다른 화폐들을 액면가치가 동일하게 유통한다면, 실질가치가 높은 화폐는 사라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화폐유통에서 뿐만 아니라, 정보 불균형으로 인한 레몬시장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사실 Gresham은 악화를 없애자는 게 아니라, 악화를 이용해 당시의 외환 시장을 장악하면 국부를 쌓을 수 있다는 제안을 한 것이라 한다.
갑자기 Gresham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건, 여러가지 상황에서 보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검색을 했을 때, 검색결과에서 스팸이나 어뷰징 문서들을 보고 있노라면, 이 말을 떠올리게 된다.
여기에서의 스팸은 스팸메일보다는 웹 특히 검색에서의 스팸문서를 의미한다. 편의상 스팸이나 어뷰징 모두 스팸으로 통칭해 이야기하겠다.
스팸과 정보는 동일한 가치를 가지지 않음에도, 이들을 동일한 가치로 판단한다면 스팸은 계속 생산되고 정보는 점차 사라질 것이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많은 규제의 근거를 제공하고, 과도한 규제로 웹의 발전은 저해될 수 있다. 검색에서 가치는 랭킹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는 제한된 페이지에서의 기회비용 발생으로까지 이어진다.
이 밖에도, 그레샴의 법칙은 커뮤니티의 성장과정이나 고객의 대응과정에서도 발생하게 된다.
커뮤니티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비용을 들여 동일한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면, 결과는 뻔하다.
일반적으로 불법적이고, 비정상적인 방법이 정상적으로 열심히 활동하는 것보다 더 편하고 싼 비용이 든다.
검색 유입 트래픽이 커뮤니티 성장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이 현상은 더욱 심화된다.
검색엔진의 취약점을 노려, 게시글을 도배하거나, 인기 검색어나 자극적인 소재를 올리는 건 쉬운 일이다.
이것을 방치하게 되면, 커뮤니티가 비정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아마도 불법적이고 비정상적인 커뮤니티만 성행하게 되고, 이는 열심히 활동하는 커뮤니티들을 몰아낼 것이다.
만일 교통질서를 지키거나 지키지 않거나 차이가 없다면...
약속된 규정을 지키지 않는데에 패널티가 없다면...
매일 아침 학교 앞 어머니회에서 실시하는 자율 규제같은 것들이 없다면...
사고를 내거나 위협을 가하는 데에 아무런 제재가 없다면...
......
고객의 대응과정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발생한다.
특정 고객의 이기적이고 부적절한 요청을 강하다는 이유만으로 요청에 일일이 대응하다가는, 다른 고객의 정상적인 문의에 대응하는 데에 지장을 줄 수 있다. 리소스는 한정되어 있기 마련인데, 불량한 내용의 요청에 일일이 대응하다가는 가치있고 진정한 고객만족을 위해 쓰여야 할 필요한 리소스는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물론, 특정 고객의 어려운 요청을 만족시키면, 충성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 내용이 다른 고객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면, 과도한 비용만 들어가는 것일 뿐이다. 장기적으로는 그 고객을 포함해서 조용한 충성고객들마저 떠나게 된다. 사실, 다른 고객들의 가치를 훼손하는 불량 고객들은 Demarketing의 대상이다.
Demarketing은 수요를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사용되는데, 건전한 수요를 위해서는 불량고객들을 줄이고 충성고객을 늘려야 한다. 여기에서 고민되는 부분은 불량고객이 충성고객으로 전환될 확률인데... 그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최선이겠지만, 매우 낮을 거라 생각한다. 또한, 오히려 충성고객이 떠날(churn) 확률과 trade-off 관계가 높을 거라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는 제대로 가치 측정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내용이 더 중요한지, 다른 고객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질가치와 명목가치의 차이를 줄이고, 가치 측정을 통해서 차별화된 가치를 부여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여기에서 문제는 정보의 가치 측정이 어렵다는 것이다. 정보가 점점 다양해짐에 따라, 이 문제는 더욱 심화된다. 주관적인 가치 판단을 모아서 객관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소셜이 등장하게 된다. 또한 가치 측정 혹은 판단을 위한 Rule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고객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서비스 철학이 중요한 것 같다.